해양 상식으로 바다를 알아볼까요? 넓고도 깊은 바닷속 이야기
매우 넓고 깊어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로 무궁무진한 바다! 이 미지의 세계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흥미롭고도 신비한 그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조개는 어떻게 진주를 만들까
조개는 입수관과 출수관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대로 입수관은 물을 빨아들이고 출수관은 물을 뿜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걸러내 작은 미생물과 플랑크톤을 먹고, 남은 물을 다시 뿜어낸다. 그래서 갯벌 위에서 조개를 찾을 때는 입수관과 출수관이 만들어낸 작은 물구멍 두 개와 8자 모양의 흔적을 찾으면 된다.
그렇다면 조개 속 진주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조개가 유기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여러 불순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혹 조갯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불순물들이 조개껍질 안쪽에 붙거나 조개의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조개껍데기를 만드는 칼슘 탄산염 성분에 둘러싸여 조금씩 커져 진주가 되는 것이다.
진주는 따로 가공하거나 광맥을 찾아 채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아몬드가 등장하면서 진주의 인기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이기에 동그랗고 광택이 나는 질 좋은 진주는 여전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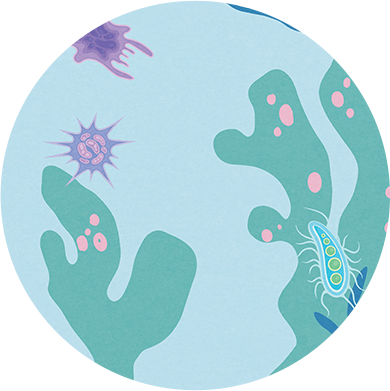
플랑크톤이 지구의 산소를 만든다고?
플랑크톤은 바다나 담수에 사는 수중생물이다. 헤엄칠 능력이 없거나 아주 약해서 물결을 따라 떠다니며 사는데 영양 방식에 따라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뉜다. 동물성은 아메바, 말미잘 등과 같이 작은 생물을 직접 잡아먹고, 식물성은 매우 작아서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데 식물처럼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얻는다.
이 중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바닷물 속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인 영양염을 합성한다. 그 과정에서 유기물과 산소가 생겨난다. 이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좋은 먹이이자, 인류가 들이키는 산소량의 약 50%를 만들어내는 산소탱크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으로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 능력인 기초생산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원인은 바로 해양 온난화. 해양 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의 표층 수온과 저층 수온 간 차이가 벌어져 순환이 악화해 영양염의 공급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바다의 기초생산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양 온난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알쏭달쏭 바다세상Ⅱ](5) 조개가 만든 불순물의 변신 ‘진주’, 연합뉴스
해양 온난화로 동해 기초생산력 뚜렷이 감소, 브릿지경제